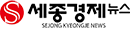“뭘 알아야 찍지.”
지방선거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다. 도지사·시장·군수 후보는 그래도 좀 알겠는데 도의원· 시의원·군의원 후보는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다. 우스갯소리로 같은 성씨라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친구 이름이랑 같아서 찍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모르는 후보를 찍은 유권자 대부분은 정당을 보고 선택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가 공보물이다. 하지만 공보물을 살펴본들 옥석을 구분할 명확한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마저도 대동소이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고 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선거가 되고 있다. 이런 인식과 이런 결과는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우리나라는 직선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투표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도 투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영혼없는 투표를 한다.
서넛이 모이면 정치이야기를 하고, 간혹 싸움을 불사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높지만, 한발 물러서 보면 후보의 정책이나 진정성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되는 상대 진영과 상대 후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착각하지만, 정치인들이 설계해놓은 구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설계해놓은 구도를 이용한다.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자치능력과 지역발전의 비전을 평가하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라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옥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후보 누구도 진지하게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가 정치인이 내세우는 필승 전략이다. 대통령 누구와 친하니 그와 나를 동일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이 짜놓은 프레임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상 정치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에게 여야정당의 가번은 의회로 가는 직행티켓이다. 잘하면 집권당, 실패해도 제1야당이라는 현실은 소수정당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 선거는 하지만 후보는 보이지 않는 이 한심한 선거판은 역설적으로 그래도 투표장으로 나서는 하는 이유다. 한 정치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머슴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는 친분 관계가 있어야 공천이 이뤄진다”고 공공연한 사실을 폭로했다. 유권자를 섬기는 정치인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민의 정치참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