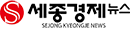[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아침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 톳토리 시내 구경 겸 산보에 나섰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목적 없이 걷는다면 처량해 보였을 길인데, 돗토리 시내를 구석구석 카메라 앵글에 담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발걸음은 활기차다. 어제 광덕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은 광덕사와 그 안쪽 오치다니 공원(樗谿公園)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외곽으로 조금 벗어나 공원방향으로 진입하자 시내 중심부와는 달리 주택의 규모가 매우 크다. 조그마한 집들만 보다가 이곳에 오니 부촌(富村) 같다. 그래도 차고의 차는 소형이다. 돗토리시 역사박물관을 지나자 삼나무로 보이는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오치다니 신사 입구에도 가지를 대부분 잃은 고목이 굵은 둥치를 세워두고 오가는 행인을 맞이한다. 세월의 흐름을 온 몸으로 맞으며 풍파에 시달리느라 가지를 모두 잃은 것처럼 비스듬히 신사입구를 지키고 선 모습이 애처롭다. 입구 현판에는 동조궁(東照宮)이라는 현판이 금박으로 각자되어 걸려있다. 신사입구에 들어서자 곰이 나타난다는 경고판이 보인다. 숲이 우거져서 그런가 곰이 살고 있다는 것이 무섭다기 보다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곰이 출몰한 것을 보도하기 위한 방송국 차량이 취재에 열중이다.

오치다니 신사는 도토리 번주(藩主) 池田光仲에 의해 1650년에 건축되었으며 1952년 7월 19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신사는 입구 배전(拝殿) · 폐전(幣殿) · 당문(唐門) · 본전(本殿)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입구 배전의 분위기는 우리 사찰의 사천왕문 같은 위치와 분위기인데 입구 양쪽으로 아무런 신상이 없이 비어있다. 배전 우측으로는 참배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우물이 있고, 좌측으로는 참배객들이 바치는 곡물 납부 내역이 붙어 있다. 배전에는 특별한 장식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을 이용하여 건축한 건물로 366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회색빛을 띠고 있다. 배전 양쪽으로는 최근 신사에 곡물을 헌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걸려있는데 위쪽에는 나무 패찰로, 아래에는 종이에 인쇄된 내역서를 부쳐 놓았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참배객들이 많은 듯하다.

배전과 당문 사이의 폐전 바닥은 중앙부를 돌로 이어 붙여 길을 만들고 양 옆으로는 석등을 세워 두었다. 삼나무를 등지고 늘어선 석등에 불이 꺼져있지만 촛불을 밝히면 더 운치가 있을 것이다. 신사를 참배하는 참배객들이 이 길로 걸어 올라가 당문으로 향했을 것이다. 당문은 폐전 위에 세워져 있다.

계단을 올라 당문 앞에 당도하니 일본 무사들의 투구 모양으로 지붕을 만든 목조 건축물이 나타난다. 단층으로 건축되었는데 높이는 일반 건물보다 단층임에도 높다. 나무를 깍아 기둥과 문을 만들고, 본체보다 앞쪽을 내어 붙혀 다시 지붕을 만들었는데 본체의 옆 지붕은 길게 날개를 편 것처럼 빼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단이 짧다. 중앙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나무방책을 세웠고, 처마 밑 대들보에는 굵은 갈색 줄을 꼬아 다섯 개의 술을 끼워 걸었다. 본체는 툇마루를 따라 돌아 갈 수 있도록 무릎 높이 정도로 나무판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건물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 비가와도 빗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해 놓았다. 처음 건축 당시부터 만들어진 수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무로 지어진 건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툇마루를 올라가야 당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 것인지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어서인지는 몰라도 문이 잠겨있어 내부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당문을 돌아 뒤로 가니 본전이 보인다. 본전의 건축양식도 당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크기는 휠씬 작다. 본전은 석축위에 석 기둥으로 길게 이어 담장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m는 될 듯하다. 쉽게 넘어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놓았고 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물답게 튼튼하고 강해 보인다. 비가 부슬거리며 내려서 인지, 흔히 신사라는 이미지가 제사(祭祀)를 올리는 곳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음기가 느껴지는 소름이 돗는다. 본전 지붕 상단부에는 3개의 둥근 나무기둥이 균형을 맞추어 장식되어 있다. 전체가 검은색인데 끝부분에는 황금빛 채색이 되어 있다. 옛날 일본 역사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식모양인데 칼을 X자로 놓아 둔 것 같기도 하다.

당문 근처에는 수령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즐비하다. 나무가 어찌나 크고 굵은지 성인 대여섯 명이 손을 잡아야 경우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굵은 나무들도 있다. 오치다니 신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듯 나무 둥치에 이끼가 가득하다. 숲길을 나와 아래로 오니 우물이 하나 있다. 지금은 철망으로 덮어 두었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우물이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는 없지만 우물 옆에는 깊은 우물물(深幽井戶)이라는 제목으로 우물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해 놓았다. 이 우물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역사적 인물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일본의 마지막 바쿠후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幕府 : 1603~1867]에 대한 이야기도 깃들어 있다.

신사를 둘러보고 나오는데 방송국에서 나온 촬영 기자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달려와 마이크를 내민다.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신사를 찾은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곰의 출연만큼 이색적인 소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사를 둘러본 소감을 말해주었다.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진다. 시간 맞추어 호텔로 가야 해서 발걸음이 빨라진다. 빗방울이 얼굴에 하얗게 떨어진다. 아침에 귀한 추억을 얻어 가는 이 기분 여행의 참맛이다.

강 대 식 사진작가 · 수필가
▶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충북 정론회 회장
▶푸른솔문학 작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