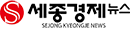송봉화, 시간을 호명하다③

시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가슴으로 읽히는 시가 있다. 백석의 시가 그렇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일부
백석은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기생 ‘자야’와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자야(본명 김영한)는 1995년, 당시 시가 1000억원이 넘는 요정을 법정스님에게 보시한다. 사람들이 통 큰 기부에 놀라워하자 “그분의 시 한 줄만도 못한데 뭘”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위의 시는 철자와 띄어쓰기를 현대에 맞게 고친 것이다.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띈다. ‘출출이’와 ‘마가리’다. ‘북관(北關)’ 즉, 함경도 사투리다. ‘출출이’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의 이름이려니 짐작을 했고, ‘마가리’는 세상에 없는 동네의 이름이겠지 생각했다. 아니면 어떻단 말인가. 한 줄 한 줄 백석의 시인데 말이다.
출출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뱁새’의 사투리였다. 그런데 마가리는 동네이름이 아니라 ‘오막살이’란다. 오막살이라도 좋고 동네이름이라도 좋다. 어차피 고대광실 기와집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 백석과 자야가 숨어들 수 있는, 오막살이 한 채가 전부인 그런 동네라고 상상했으니 말이다.

만약 백석과 자야가 살림을 이루었다면 그들의 집은 이랬으리라. 막돌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을 볏짚도 구하지 못해 굴참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기와처럼 얹은 집. 햇볕을 들이고 연기를 내보내는 ‘까치구멍’이 열려있는 집. 방과 맞닿아 흰 당나귀를 매어둘 외양간이 딸려있는 백석과 자야와 흰 당나귀의 집.
백석과 자야는 캄캄한 밤, ‘고콜’ 불빛이 어른거리는 서로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기와 만년 굴피 천년’이라고 오두막이라도 한 생애를 살기에 충분했으리라. 산골물이 흘러내려오는 뒤꼍에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길 바라듯 통방아가 느릿느릿 돌아갈 것이다. 그런 집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