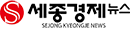[윤상원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한 발명가를 알고 있다. 평생 ‘발명 밥’을 먹고 있는 분이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발명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육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발명을 풀어가는 전략이 참 도전적이고 치밀하다.

내막은 이렇다. 메모 달인이라는 별명답게 항시 그분은 발명수첩을 들고 다닌다. 그 안에는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돈이 될 만한 발명만 고집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시험해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확인에 확인을 거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명이 숙성되면 돈 되는 아이템을 감각적으로 찾아낸다. 바로 그때 특허 등록절차를 밟는다. 과거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닥치는 대로 특허출원했지만, 진정 돈 되는 특허는 소수였다고 한다. 이제는 전략을 바꿨다. 돈 되는 특허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특허를 팔기도 하고, 직접 생산하여 판매도 한다. 이분에게는 장롱특허란 존재하지 않는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알토란 발명가이자, 돈을 부르는 특허경영자다. 발명을 두고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한 인생을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최근, 조선일보의 새로운 기획기사가 눈길을 끈다. 주제는 ‘정부 R&D의 허상’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연 19조를 투자하는 R&D 사업에서 70%가 사실상 장롱특허이며 원천기술 개발보다 성과에만 집착한 보여주기 이벤트’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눈요기를 위한 특허만 양산한 것이다. 폐단이 이 정도니 후유증이 무섭다.
이어지는 보도내용은 더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국의 R&D 사업화 성공률을 영국(71%), 미국(69%)과 비교했을 때 20%에 그치며 이러한 결과는 특허 등록 수치에만 집착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술만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특허출원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전시행정의 결말은 불 보듯 뻔하다. 더는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국가 경제와 직결된 중대사안(事案)이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매스컴이 자꾸 들쑤시니, 야단법석은 특허청 몫이다. 다양한 사업이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혜택은 덩치 큰 대기업이나 국책 연구소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명가들은 우수한 특허를 출원하고서도 여러 이유로 사업화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특허는 단지 때를 못 만났을 뿐이다. 늦었다고 장롱특허가 결코 아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필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지원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부족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발명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장롱특허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장롱특허들은 어둠 속을 뚫고 나와 세상의 밝은 빛을 봐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장롱특허를 꽃 피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끝까지 공들여야 한다. 찾고 찾는 노력만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진득하게 실천했으면 한다. 단순 홍보의 구색 맞추기는 국민이 금방 알아본다. ‘장롱특허 드디어 빛을 보다’란 제목의 신문기사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