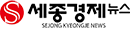[윤상원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나는 대한민국의 늦둥이 아빠이면서 평범한 월급쟁이다. 몇 달 전 40대 중반 나이에 둘째 딸을 보았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녀석이다. 친구들과 비교해도 빠른 편이 아니다. 10년 만에 잉태한 생명은 하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둘째의 재롱에 하루하루가 살맛 난다. 직장에서는 딸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상상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딸 바보는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직장 동료들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새삼 묻는다. 새로 태어난 둘째 딸이 너무 예뻐 죽겠다고 말을 건 낼 때마다 동료들은 축하와 함께, “그 나이에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하느냐?”고 걱정 태산이다.
이제 곧 오십 대로 들어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루하루 커가는 두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걱정부터 앞선다. 모두 돈 탓이다. 얼마 전이었다. 아내가 두 달 된 둘째의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았다. 필수 예방접종 외에 처음 듣는 선택접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상한 이름에 무슨 종류가 이리도 많은지. ‘수두·헤모필루수 인플루엔자·폐구균·폴리오·디프테리아 백신 등등’ 거기에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몇 회에 걸쳐 맞혀야 한다. 가격은 무려 100만 원을 육박한다. 자식 사랑에 접종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월급쟁이 신세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아내는 워킹 맘이다. 나 혼자 벌어서는 가정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당연히 큰애를 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주위에 믿고 맡길 만한 곳도 없다. 집 가까운 어린이집은 남 이야기다. 대기자 명단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모 마음은 안쓰러움에 그저 넋을 놓고 있을 뿐이다. 아이 학원 문제는 골칫 덩어리다. 학원 찾아 해맨 지 벌써 몇 년째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큰 아이의 설움을 생각하면 눈물이 시야를 가린다.
육아 문제의 끝이 안 보인다. 지금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 팔순이 다된 홀로 계신 어머님이 큰 아이의 어머니 역할을 감내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님께 또 다른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 큰애에 이어 둘째까지 어머님께 맡겨야 할 판국이니 말이다. 장남으로서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한 처지에 오늘도 속마음만 타들어 간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이 같은 조건에 누가 마음 편하게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집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동안 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전세로 출발했다. 없는 살림에다 월급쟁이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치솟는 전세자금 때문에 점점 도심을 벗어나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했다. 철새나 다름없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꾹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큰 아이가 조금이라도 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장만해야만 했다. 학원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 집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티끌 모아 저축해둔 돈이 부족해 최대한 대출을 받았다. 아무리 초저금리 시대라 해도 대출 이자는 부담 백배다. 매달 나오는 대출 이자는 나에게 또 다른 부채로 다가왔다. 둘째를 낳는다는 건 극도의 사치라는 생각이다.
도저히 애를 낳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젊은 세대가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들에겐 출산은 무관심 영역이다. 연일 매스컴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어느새 들리지 않은 지 오래다. 올해 태어날 아기 수가 작년 43만 명대에서 42만 명대로 떨어져 1925년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위기의식 없이 태평하다.’
정책이든, 정치든 뭔가 잘못되었으니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한숨만 저절로 나온다. 최근 저출산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정부는 젊은 세대가 부담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어려운 조건을 감내하는 월급쟁이들의 비애를 정부는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옛말에 ‘제 복 제가 타고난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속담이 맞는다고 하지만 이 속담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경제력이 없으면 제대로 자식 키우기는 물론, 모든 게 힘들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는 최근의 통계청 발표는 나의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하다.
요즘의 서민 경제는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양상이다. 빈자(貧者)가 증가하다 보니, 출산은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4년 기준으로 1.25명이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다. 초라한 성적표다.
나는 학교에서 인구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배웠다. 왜 아직도 저출산에 대한 범국민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민초(民草)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